유엔 인권위원회 식량특별조사관인 장 지글러가 썼다. 세계인구 60억중에 8억5천만이 기아에 시달리고 있다. 약 14%
기아(飢餓)라는게 정확히 뭘까? 아예 못먹는 걸까? 아님 하루에 한끼 먹는것도 기아라고 할까?
아님 먹는것 먹는데 영양분이 모자라게 먹는 걸 기아라고 할까?
한문으론 주릴 '기' 주릴 '아' 해서 주리고 주린다.
사전적으론 그냥 잘 못먹는 것이며, 개인의 생각에 따라 기아는 다르게 정의될것 같다.
내가 내리는 기아란 생명을 겨우 유지하며, 약간의 위험에도 쉽게 사망에 이를 수 있게 끔 하는 부족한 영양섭취의 상태라고 정의한다.
저자는 2006년을 기준으로 생산되고 있는 식량의 총 량은 약 120억 인분이라고 한다.
한 사람이 2인분의 음식을 먹어도 되는 만큼의 양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태에서 기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14%라는 것은 뭔.가.잘.못.되.었.구.나.! 라는 것이다.
엉국교회의 멜서스라는 한 목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계속해서 증가하는 인구와 식량위기에 위험관리 요소로서 기아로 사망하는
비율이 적당히 유지되는것은 올바른 일이다."
세상은 이렇게 생겼다. 이러한 사람들이 소위 종교의 지도자로 있는 것이 현실이며, 또한 그 의견도 일리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인간도 있다는 말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만이 만들어 낼 수 있다.
물론 멜서스란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한지는 꽤 오래전에 식량의 의미가 좀 더 생사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던 시기에 했었던
말일 것이란 생각도 해본다.
모든 문제의 분석에 있어 첫 번째는 현상을 파악하고 어떠한 특질을 가지고 있는 문제인가를 빨리 알아차리는 것이다.
그 점에 있어 저자가 키로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아래와 같다.
기아는 경제적/구조적 기아로 나눈다고 하는데, 구조적 기아가 큰 문제라고 나누고 있다.
구조적 기아란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회복할 수 없는 악순환의 구조에 빠져 있는 기아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구조적 기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신경쓰고 노력해야 하는것이다.
기아의 대부분은 아프리카, 아시아, 러시아관련 국들, 북한 등... 제 3세계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다.
기아의 희생량은 대부분 아이들이 되며 이들은 비타민 A부족으로 인한 시력상실과 기아로 태어나자 마자 많은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1분에 250명이 태어나고 이 중 197명이 제 3세계에서 태어나며 이들 중 상당수가 기아를 겪는다고 한다.
이런 아이들을 프랑스의 레지드브레라는 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나면서 부터 십자가에 못박힌 아이들"
이러한 상황과 아주 극명히 대비되는, 대비라는 말을 쓸 수는 없는 상황같지만, 미국의 소가 전 세계의 옥수수 생산량 중
25%를 소비한다고 한다. 또한 일부국가에서는 시가(담배)를 위해 40만 마리의 소를 도축하기도 했다고 한다.
세상은 무릇 위와 같이 생긴것이 맞다. 어떤이에게는 꿈이 어떤이에게는 한 낱 유희일 뿐이며, 어떤이의 고통은 어떤이의
돈 벌이 수단일 뿐인것이 이 세상이다. 세상뒤에 숨어 있는(이제는 많이 드러난) 보이지 않는 힘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는 사람만이 이를 해결할 수 있다.
영화 "블러드 다이아몬드"의 배경이된 아프리카의 다이아몬드 생산국인 시에라리온처럼, 수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유럽과
미국의 경제 식민지로 자국의 기본적인 생산노동성은 상실한체, 경쟁작물을 재배하며, 기아와 고통으로 허덕이는 삶을 살아가
고 있다.
기득권국(소위 강대국)은 이런 경제 식민지국가의 수뇌에게 뇌물과 권력을 쥐게 해주고, 대신 국민의 피와 땀으로 만든 돈을
가지고 삶을 논의한다.
부르키나파소의 상카라는 대표적으로 올바른 정신을 가진 아프리카의 지배자였다.
상카라는 암살당했는데 군부와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위한 대통령을 죽이고 그 나라를 강대국의 경제식민지로 전락
시켰다. 바로 이런것이 구조적 기아를 만드는 가장 전형적인 모델이 되어버린다.
기아를 해결할 수 있는 논과 밭과 그 기술이 없으며, 단순히 강한자의 공급에 의해서만 생명을 유지 할 수 밖에 없는 구조
이러한 것을 구조적 기아라고 한다.
곰곰히 생각해보자 왜 이렇게 된걸까? 그렇다 바로 그것이다.
책에서는 기아에 대한 큰 적으로 금융시장이란것을 지목했다. 모두 경쟁을 해야하며, 자유롭게 부를 추구할 수 있다는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신자유주의(시장원리주의)라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 조차 지키지 못하며, 기아로 목숨을 잃어가는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위선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준것이다.
서울대 윤석철 교수는 이런말을 책을 통해 했다.
" 처지가 곤궁한 자는 겸손해지기 쉬우나, 모든것을 갖춘이는 겸손해지기 어렵다. 그들의 오만은 인간 본성이며,
그들이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인생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 하며, 이를 갖기 위해 꾸준히 공부해야 한다."
세상의 성공은 위와 같은 철학은 커녕 기본적인 도덕에 대한 관념이 없어도 세속적인 성공은 거둘 수 있으며, 오히려 이러한 도덕과
철학은 방해가 되기 쉽상이다.
그럼 이렇게 세상을 어둡게만 보고 이책을 덮어야 하는가?
라디오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들은적이 있다.
하얀 우유한 컵에 잉크한방울을 떨어뜰이면 금세 색이 변한다. 하지만 검은 잉크한통에 몇리터의 우유를 부어도 잉크는 색이
변하기가 힘들다.
일단 위의 것을 이해해야 한다. 세상은 쉽게 변하지 않으며, 흰색일 수록 쉽게 검게 물들기 쉽게 생겨있다.
성인인 마더 테라사 수녀는 말씀하셨다. "한 번에 한 명씩"
하지만 최근은 이런 한번에 한명씩이상 살릴수 있는 사람도 많이 나오고 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는가?
바로 철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다. 그 철학이 책을 바탕으로한 사고에서 나왔으면 두말하면 입만 아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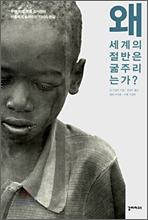
평점 : 9.0
기아(飢餓)라는게 정확히 뭘까? 아예 못먹는 걸까? 아님 하루에 한끼 먹는것도 기아라고 할까?
아님 먹는것 먹는데 영양분이 모자라게 먹는 걸 기아라고 할까?
한문으론 주릴 '기' 주릴 '아' 해서 주리고 주린다.
사전적으론 그냥 잘 못먹는 것이며, 개인의 생각에 따라 기아는 다르게 정의될것 같다.
내가 내리는 기아란 생명을 겨우 유지하며, 약간의 위험에도 쉽게 사망에 이를 수 있게 끔 하는 부족한 영양섭취의 상태라고 정의한다.
저자는 2006년을 기준으로 생산되고 있는 식량의 총 량은 약 120억 인분이라고 한다.
한 사람이 2인분의 음식을 먹어도 되는 만큼의 양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태에서 기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14%라는 것은 뭔.가.잘.못.되.었.구.나.! 라는 것이다.
엉국교회의 멜서스라는 한 목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계속해서 증가하는 인구와 식량위기에 위험관리 요소로서 기아로 사망하는
비율이 적당히 유지되는것은 올바른 일이다."
세상은 이렇게 생겼다. 이러한 사람들이 소위 종교의 지도자로 있는 것이 현실이며, 또한 그 의견도 일리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인간도 있다는 말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만이 만들어 낼 수 있다.
물론 멜서스란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한지는 꽤 오래전에 식량의 의미가 좀 더 생사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던 시기에 했었던
말일 것이란 생각도 해본다.
모든 문제의 분석에 있어 첫 번째는 현상을 파악하고 어떠한 특질을 가지고 있는 문제인가를 빨리 알아차리는 것이다.
그 점에 있어 저자가 키로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아래와 같다.
기아는 경제적/구조적 기아로 나눈다고 하는데, 구조적 기아가 큰 문제라고 나누고 있다.
구조적 기아란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회복할 수 없는 악순환의 구조에 빠져 있는 기아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구조적 기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신경쓰고 노력해야 하는것이다.
기아의 대부분은 아프리카, 아시아, 러시아관련 국들, 북한 등... 제 3세계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다.
기아의 희생량은 대부분 아이들이 되며 이들은 비타민 A부족으로 인한 시력상실과 기아로 태어나자 마자 많은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1분에 250명이 태어나고 이 중 197명이 제 3세계에서 태어나며 이들 중 상당수가 기아를 겪는다고 한다.
이런 아이들을 프랑스의 레지드브레라는 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나면서 부터 십자가에 못박힌 아이들"
이러한 상황과 아주 극명히 대비되는, 대비라는 말을 쓸 수는 없는 상황같지만, 미국의 소가 전 세계의 옥수수 생산량 중
25%를 소비한다고 한다. 또한 일부국가에서는 시가(담배)를 위해 40만 마리의 소를 도축하기도 했다고 한다.
세상은 무릇 위와 같이 생긴것이 맞다. 어떤이에게는 꿈이 어떤이에게는 한 낱 유희일 뿐이며, 어떤이의 고통은 어떤이의
돈 벌이 수단일 뿐인것이 이 세상이다. 세상뒤에 숨어 있는(이제는 많이 드러난) 보이지 않는 힘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는 사람만이 이를 해결할 수 있다.
영화 "블러드 다이아몬드"의 배경이된 아프리카의 다이아몬드 생산국인 시에라리온처럼, 수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유럽과
미국의 경제 식민지로 자국의 기본적인 생산노동성은 상실한체, 경쟁작물을 재배하며, 기아와 고통으로 허덕이는 삶을 살아가
고 있다.
기득권국(소위 강대국)은 이런 경제 식민지국가의 수뇌에게 뇌물과 권력을 쥐게 해주고, 대신 국민의 피와 땀으로 만든 돈을
가지고 삶을 논의한다.
부르키나파소의 상카라는 대표적으로 올바른 정신을 가진 아프리카의 지배자였다.
상카라는 암살당했는데 군부와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위한 대통령을 죽이고 그 나라를 강대국의 경제식민지로 전락
시켰다. 바로 이런것이 구조적 기아를 만드는 가장 전형적인 모델이 되어버린다.
기아를 해결할 수 있는 논과 밭과 그 기술이 없으며, 단순히 강한자의 공급에 의해서만 생명을 유지 할 수 밖에 없는 구조
이러한 것을 구조적 기아라고 한다.
곰곰히 생각해보자 왜 이렇게 된걸까? 그렇다 바로 그것이다.
책에서는 기아에 대한 큰 적으로 금융시장이란것을 지목했다. 모두 경쟁을 해야하며, 자유롭게 부를 추구할 수 있다는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신자유주의(시장원리주의)라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 조차 지키지 못하며, 기아로 목숨을 잃어가는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위선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준것이다.
서울대 윤석철 교수는 이런말을 책을 통해 했다.
" 처지가 곤궁한 자는 겸손해지기 쉬우나, 모든것을 갖춘이는 겸손해지기 어렵다. 그들의 오만은 인간 본성이며,
그들이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인생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 하며, 이를 갖기 위해 꾸준히 공부해야 한다."
세상의 성공은 위와 같은 철학은 커녕 기본적인 도덕에 대한 관념이 없어도 세속적인 성공은 거둘 수 있으며, 오히려 이러한 도덕과
철학은 방해가 되기 쉽상이다.
그럼 이렇게 세상을 어둡게만 보고 이책을 덮어야 하는가?
라디오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들은적이 있다.
하얀 우유한 컵에 잉크한방울을 떨어뜰이면 금세 색이 변한다. 하지만 검은 잉크한통에 몇리터의 우유를 부어도 잉크는 색이
변하기가 힘들다.
일단 위의 것을 이해해야 한다. 세상은 쉽게 변하지 않으며, 흰색일 수록 쉽게 검게 물들기 쉽게 생겨있다.
성인인 마더 테라사 수녀는 말씀하셨다. "한 번에 한 명씩"
하지만 최근은 이런 한번에 한명씩이상 살릴수 있는 사람도 많이 나오고 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는가?
바로 철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다. 그 철학이 책을 바탕으로한 사고에서 나왔으면 두말하면 입만 아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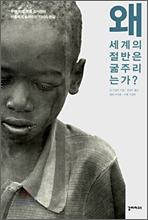
평점 : 9.0